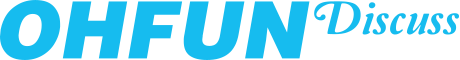그런데 이름은 '순댓국'이면서 막상 순대는 몇알 들어가 있지 않은 순댓국을 마주하게 된다. 대부분의 순댓국에는 순대가 서너알 들어가는데 양이 좀 더 많은 '특'을 시켜도 6~7알 수준이다.


심지어 방배동의 한 재래시장에 있는 유명 순댓국집의 순댓국에는 순대가 단 한 알도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순댓국'이라고 불린다.
![순대 3]](/contents/article/images/2017/0911/1505112157532421.jpg)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일까. 음식 평론가 황교익이 그 답을 내놓았다.
지난해 2월 방송된 tvN '수요미식회'에서 황교익은 "(순대가 단 한 알도 없어도) 순대국이에요"라며 "지금 형태의 순대가 '순대'로 불린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순대'는 돼지 내장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내장만 넣고 끓인 돼지 내장탕이 바로 순댓국"이라고 했다.

창자에 당면 등 속을 채워넣은 형태의 순대를 '순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라고 한다.
그 이전에는 이러한 형태의 음식을 '핏골집(피골집)'이라고 불렀다. 피(선지)를 창자에 집어 넣은 선지 순대라는 뜻이다.

이 내용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시 화제가 되면서 "어쩐지 순대가 세알 들어가있더니", "근현대 소설을 보다 보면 사람 내장도 '순대'라고 부르던데 그게 비유한 게 아니라 정말 내장을 순대라고 부르는 거였구나", "순대가 순대된 지 얼마 안됐구나"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