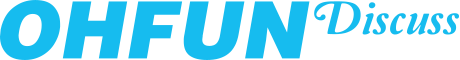올림픽에서 개헤엄을 치는 선수가 있었다. 꼴찌 했지만 기립박수까지 받았다.
이번에 소개할 수영 선수는 에릭 무삼바니라는 인물이다. 사실 올림픽 전까지 수영 선수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다. 원래는 전직 축구 선수 출신의 그저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는 아주 우연한 기회의 연속으로 올림픽 무대까지 올랐다. 무삼바니는 적도기니라는 나라의 사람이다. 적도기니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로 꼽힌다. 그런데 이 가난한 나라에서 무삼바니는 어떻게 수영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

시작은 사소했다. 무삼바니는 라디오에서 우연히 올림픽에 나갈 수영 선수를 선발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적도기니는 수영 강국이 아니다. 특히 수영 종목에서 흑인은 그다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다는 인식이 팽배할 정도로 아프리카는 수영에서 그다지 힘을 쓰지 못하는 곳이었다.
그런데 국제수영연맹의 결정이 반전을 만들어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국제수영연맹은 새천년을 맞이해 수영 불모지 국가들에 올림픽 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수영에 관심 없던 적도기니도 뜬금없이 서아프리카 지역에 배당된 출전권을 받았다. 이 출전권을 활용해야 했다.
무삼바니는 호기심에 수영 선수 선발전에 지원했다. 그런데 적도기니에서 수영 선수 선발전에 참가한 사람은 무삼바니가 유일했다. 결국 무삼바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올림픽 출전권을 얻었다.
무삼바니에게 수영은 그저 해안가에서 치는 물장구정도였다. 그런데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를 나가야 했다. 당시 적도기니에는 한 호텔에 있는 10m짜리 수영장이 유일했다. 이 호텔은 자국의 첫 올림픽 수영 무대 출전에 나서는 무삼바니를 위해 새벽 시간에 수영장을 비워줬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삼바니는 낮에 해안가를 헤엄치며 올림픽을 준비했다. 그의 코치는 어부들이었다.

그리고 무삼바니는 올림픽 무대에 입성했다. 처음으로 정식 규격의 수영장을 만난 무삼바니는 겁에 질렸다. 10m짜리 수영장에서 연습하던 그의 눈 앞에는 50m 레일의 수영장이 있었다. 무삼바니는 두려움에 휩싸여 기권하려 했지만 진행요원들이 '당신의 국민들을 생각하라'는 설득 끝에 출전을 결심했다.
다음 날 무삼바니는 100m 예선전에 출전했다. 무삼바니는 비장한 모습이었지만 정작 주변 선수들은 어리버리한 흑인 선수들의 모습을 굉장히 신기해 했다고.
그런데 또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다. 당시 예선전 무삼바니의 조에는 총 세 명이 출전했다. 무삼바니가 언제 출발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남은 두 명이 부정출발로 실격한 것. 결국 무삼바니는 홀로 100m 레이스를 펼쳤다.
무삼바니의 기록은 형편 없었다. 어부들에게 배운 수영 솜씨라 자유형이나 평영 같은 영법은 전혀 몰랐기에 개헤엄으로 물살을 갈랐다. 50m에 다다른 순간 이미 다른 선수들의 100m 기록을 초과한 상태였다. 하지만 호주 사람들은 모두가 기립해 무삼바니를 응원했고 결국 1분 52초의 기록으로 100m 완주에 성공했다.
이는 무삼바니의 마지막 올림픽 무대였다. 그는 이후 인터뷰에서 "남들은 메달을 따기 위해 수영 했지만 나는 익사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다"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무삼바니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출전권도 획득했지만 적도기니의 행정 실수로 불참했다. 이후 적도기니의 수영 감독으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