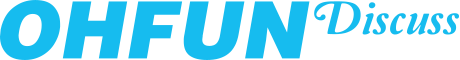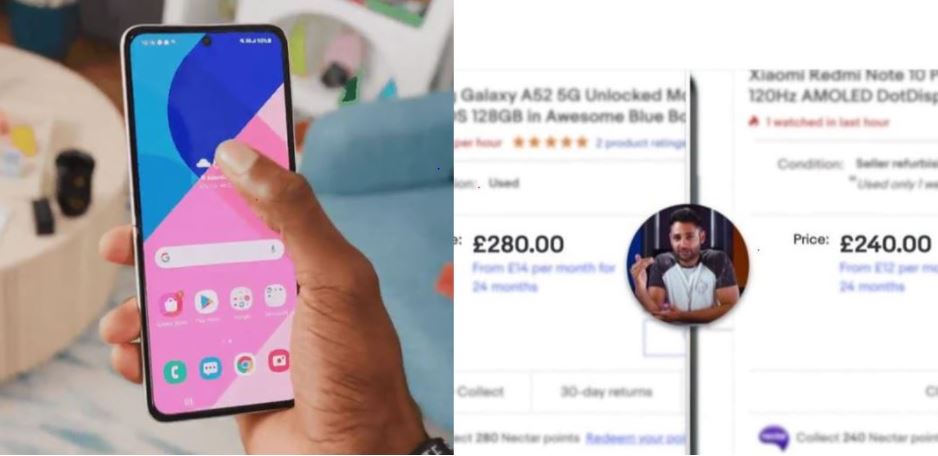
#1. A씨는 지난해 10월 한 통신사 판매점에서 11개월 동안 사용한 휴대폰을 반납하고 동일한 모델의 새 단말기로 바꿨다. 청구요금을 2~3만원 낮춰 주겠다는 판매점의 설명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때 사은품 명목으로 5만원을 받았다. A씨는 며칠 뒤 반납한 단말기와 새 단말기의 할부금이 모두 청구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판매점에 새 단말기 할부금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판매점은 거부했다. 새 단말기 할부금도 청구된다는 사실을 설명했고, 반납한 단말기를 중고 매매한 대금으로 5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2. B씨는 지난해 5월 같은 통신사의 다른 판매점에서 청구요금을 7만원대로 낮춰 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7개월가량 쓴 단말기를 반납한 뒤 동일 모델의 새것으로 바꿨다. 다음달 B씨는 새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된 10만원대 요금 청구서를 받았다. B씨는 판매점에 항의해 약속한 청구요금을 초과한 금액과 반납한 단말기 잔여할부금 명목으로 36만2010원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반납한 단말기와 새 단말기 할부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추가 배상을 요구했다.
이같은 경우 판매점이 소비자가 반납한 단말기 가격의 70%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와 B씨가 각각 사용하던 단말기에는 2년 사용 후 교체하면 반납한 단말기의 잔여할부금을 변제해주는 부가서비스가 적용된다"며 "고가의 할부금을 추가로 부담하면서까지 동일 모델의 단말기로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단말기의 사용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단말기를 판매점에 인도한 사실 등으로 미뤄 볼 때 "계약 당시 반납한 단말기의 교환가치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판매점은 반납한 단말기의 교환가치에 상당한 금원을 소비자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소비자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각 판매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함께 판매하면서 분쟁 발생 시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통신업계에 보다 철저히 계약내용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게 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판매점을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계약 전에 구두로 안내받은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기존 단말기의 잔여할부금이나 해지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청구서 등을 통해 계약내용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