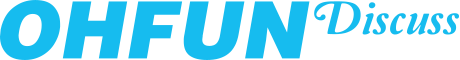서로 미루다가 사고가 일어날 뻔 했다.
경찰관과 소방대원이 서로 취객의 처리를 미루는 일이 발생했다. 연말연시에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취객을 보는 일은 종종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취객을 누가 맡아야 하는 것일까? 좀 더 현장에서의 명확한 책임 분담과 역할 구분이 필요해 보인다.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이야기의 시작은 지난 11일 낮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경찰은 112 신고 전화를 받았다.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의 한 중국집이 건 전화였다. 중국집에서는 "손님이 술을 먹고 안나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했다. 따라서 경찰은 해당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출동했다.
중국집에 도착해 경찰이 발견한 것은 한 명의 남성이었다. 가게 바닥에 엎어진 상태로 누워 있었고 구토한 흔적이 있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술 취해 행패를 부린다거나 물건을 부수면 연행할 수 있지만 그냥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 구토한 흔적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경찰은 구토를 했다는 점에 주목해 응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한 경찰관은 식당 직원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뒤 자리를 떠났다. 식당 측은 119 신고를 통해 소방대원을 가게로 불렀다. 그런데 현장을 방문한 소방대원의 판단은 경찰과 달랐다.
119 구급대원은 현장의 남성을 보고 병원으로 옮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소방 관계자는 "외상이 있던 것도 아니고 심장박동과 혈압 등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정상이었다"라고 전했다. 구급대원은 이렇게 판단해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지만 경찰 측은 이를 거절했다.
이 때부터 양 측의 실랑이가 시작됐다. 구급대원은 계속해서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경찰 측은 "112 전화를 계속 거는 건 업무방해"라고 맞섰다. 결국 해당 취객은 최초 신고 이후 약 세 시간 만에 금천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다. 이를 놓고 경찰과 소방은 서로 책임 공방 중이다.
만약 취객의 상황이 더 위험했다면 경찰과 소방이 서로 책임을 논하는 동안 더욱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이런 상황을 대비해 서로 명확한 역할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소방의 역할이 좀 더 커보인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토사물이 기도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병원 이송이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