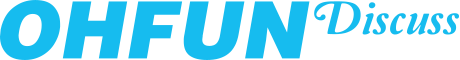첫 시집이 유작이 되어버린 송재익 시인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9월 2일 세상을 떠난 송재익 시인의 장례식장. 영정 아래 시집이 놓여 있다. 시집 ‘내 마음의 오두막’은 송재익의 첫 시집인데 책이 나온 다음날인 9월 2일 송시인은 눈을 감았다. 송재익은 결핵성 관절염으로 장애가 점점 심해지는 것은 물론 평생 통증에 시달리며 살았다.
하지만 그는 지난 4년 동안 요양병원을 전전하면서도 시를 썼다. 투병 중에 불태운 시에 대한 열정으로 그는 지난 해 장애인문학지‘솟대문학’추천완료를 받았고 올해 도서출판 솟대에서 시집을 발간하게 되어 평생의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고 기뻐했다.
그런데 송시인은 지난 8월 15일 중환자실로 옮기면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는 ‘솟대문학에 연락해서 시집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를 했고, 그 소식에 솟대문학에서는 서둘러 인쇄를 하였지만 첫 시집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송시인은 세상을 떠났다.
딸 송슬기(27세) 씨는 "돌아가시기 전날 시집이 도착해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한 편 한 편 읽어드렸는데 아버지 모습이 편안해 보였다"며 "아버지는 장애와 통증 때문에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는 시가 있어 외롭지 않았고 시인인 것을 자랑스러워했다”고 전했다.
삐걱, 삐거덕 / 그리움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는 / 집 한 채 있다 // 세월에 변하지 않는 / 사랑으로 기둥을 세우고 / 눈비로 썪지 않는 / 정으로 서까래를 얹은 / 그집 // 빨갛게 멍든 기도를 / 마당 한가득 널어놓고 / 오직 맑은 날이기만을 바라시던 / 님, 그님 // 보고 싶다를 따라가다 보면 / 잡힐 듯 잡히지 않는 / 그런 집 한 채 있다 // - 시, ‘내 마음의 오두막’ 전문
송시인은 서문에서 ‘무지의 작은 공간을 하염없이 헤매다 시 라는 날개를 달고 이렇게 당신 곁을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아름답다고 삶이 끝나는 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여 시가 있어 행복하다고 고백했다.
빈소에는 송시인이 세상에 두고 가는 남매가 있었는데 부인 없이 두 아이를 키웠지만 고단한 삶 속에서도 시처럼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다.
빈소를 찾은 솟대문학 방귀희 발행인은 시집을 영정 앞에 놓으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였다. ‘지금도 어디서엔가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장애문인이 많을 텐데 송재익 시인처럼 돌아가시기 전에 출간을 해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며 장애인문학 출판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송시인은 시집 제목처럼 내 마음의 오두막으로 먼 길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시집이 자유와 사랑을 갈망한 이름 없는 시인의 삶의 흔적을 남기는 유일한 유산이 되었다.
[사진 = 송재익 시인 ⓒ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