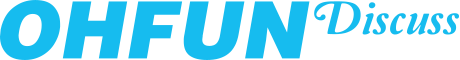서던캘리포니아대학 가정의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인 캔 머레이는 타임지에 "왜 의사들은 편안히 죽는가?(Why Dying Is Easier for Doctors)"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이 글에서 저자는 동료 의사인 찰리가 췌장암 진단을 받은 후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않고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 남은 시간을 원하는대로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시작한다.
의사였던 찰리 뿐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소생이 불가능한 불치병 진단이 나오게 되면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않고 죽음을 초연하게 맞는 풍조를 얘기하면서 '삶의 연장'을 목표로 한 의료시스템과 가족들의 바램, 그리고 환자 자신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간다.

저자는 현대 의학의 한계와 '헛된 치료' 때문에 실제로 생명을 살린다는 목적의 과잉의료 행위가 환자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쓸쓸하게 병원에서 홀로 죽음을 맞는 공포스러운 일임을 강조했다.
동료 의사들은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내가 만약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겠다고 약속해 줘."라는 얘기를 자주한다. 나아가 실제로도 심폐소생술(CPR)을 하지 말라는 목걸이나 문신을 새긴 사람들 이야기도 꺼낸다. CPR이 알려진 바와 달리 '비현실적인 기대'에 불과하다는 걸 의사들은 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환자와 가족들의 바램 때문에 '헛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은 자신들을 과잉치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삶의 연장'보다는 '존엄사'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는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고 신해철의 죽음으로 인해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는 요즘, 자신과 가족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 한번쯤 읽어볼만한 이야기다.
번역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