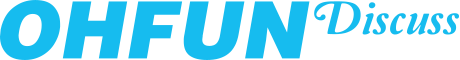최근 정확한 주소도 입구도 알 수 없는 '스피크이지 바'가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흥미돋는 간판도 없고 입구도 없는 술집들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화제로 떠올랐다.
게시물을 쓴 누리꾼은 지난 3월 조선일보의 기사를 인용해 '스피크이지 바(speakeasy bar)'를 소개했다.
스피크이지 바는 무허가 술집이라는 뜻으로 1919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 금주법 시대에 사람들이 몰래 술을 마시기 위해 만들어진 비밀 술집이다.
단속을 피해 만들어진 비밀 술집인만큼 간판이 없고 입구가 숨겨져있었다. 스픽이지라는 이름은 단속을 들킬까봐 손님들에게 "작게 말해(speak easy)"라고 주의를 주었던 것에서 유래했다.
이런 콘셉트로 서울에 생겨나고 있는 스피크이지 바들은 (당연히 불법은 아니고) 은밀한 공간 속 나만 알고 있는 아지트라는 느낌을 주고 있어 입소문을 타고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청담동에 있는 스피크이지바 '르 챔버'는 서재처럼 꾸며진 공간 책장에서 딱 한권의 책을 착아내 눌러야 입구가 열린다.



한남동과 제주에 있는 '더 부즈'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바의 입구라고 알려진 빨간 공중전화 박스에서 지문을 눌러야만 들어갈 수 있다.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 있는 '찰스 에이치'는 기둥과 입구가 하나로 되어있어 마치 해리포터 시리즈를 떠올리게 한다. 이 곳은 지난 4월 올리브 테이스티로드에 소개되기도 했다.


많은 고객이 방문하는 것보다는 나만의 아지트라는 아늑함과 편안함을 전하는 서비스를 중요시하다보니 들어가는 방법 말고도 제한적인 면은 더 있다.
SNS에 기념 사진을 올리는 것은 괜찮으나 정확한 주소를 노출하지 않아야하고 사진에 본인과 일행 외의 방문객 얼굴이 나와선 안된다.
또 28살 이상인 사람만 입장할 수 있는 곳도 있다.
이런 저런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출입구에 대한 재미와 아늑함을 찾아오는 손님은 입소문을 타고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다.
이 내용에 누리꾼들은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외국이나 판타지 소설에서만 보던 곳이 한국에도 있다니", "범죄의 장소로 악용될까 우려되지만 건전하게만 운영된다면 좋을듯" 등 호기심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