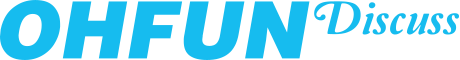이 가족사진 속 잠든 아기를 보고 있으면 슬며시 미소가 나온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어딘가 슬퍼보인다.
사실 이 아기는 잠든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숨진 상태였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15일(현지시각) 19세기에 유행했던 '사후 사진' 여러장을 공개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기사 원문에서 사진을 볼 수있습니다. 다만 사진이 불편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Stay dead still: The gruesome 19th-century portraits of dead children https://t.co/SGEcRXdpIt pic.twitter.com/1Q4I6CN1Ar
— Daily Mail Online (@MailOnline) 2016년 12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19세부터 20세기 초까지 죽은 아이와 함께 '사후 사진'을 찍는 게 유행이었다고 한다.
당시 디프테리아, 발진 티푸스, 콜레라 등 전염병이 돌았는데 항생제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은 병에 걸렸다 하면 죽어나가기 일쑤였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장례를 치르기 전 아이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당시 서민들에게는 가족 사진을 찍는 것도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웠지만 아이를 평생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사진은 아이의 생전 모습과 최대한 비슷하게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평온하게 잠이 든 것처럼 연출했는데 일부 사진은 아이가 눈을 뜬 것처럼 보이게 하기도 했다.
섬뜩한 사진이지만 자식을 떠나보내며 가슴에 자식을 품은 부모들에겐 사랑하는 아이를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 그리움의 흔적을 어찌 섬뜩하다거나 잔혹하다고만 할 수 있을까.
처음엔 "어떻게 죽은 아이를 편히 쉬지도 못하게 하고 사진을 찍냐"고 쓴소리를 내던 누리꾼들도 점차 부모들을 이해하고 먹먹한 눈빛으로 사진을 바라봤다.
한편 이 가슴아픈 사진은 1941년 세균학자 플레밍이 항생제 '페니실린'을 개발해내면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일이 점점 줄어들면서 함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