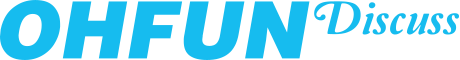역대 동계올림픽 중 최고 수준의 빙질이라고 호평받고 있는 평창올림픽 경기장의 빙질의 비결이 공개됐다.
지난 9일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된 평창 동계올림픽. 역대 최고 규모의 동계올림픽답게 많은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경기마다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뽐내며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그 비결을 무엇일까? 경기에 임한 선수들은 입을 모아 빙질이 우수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피겨스케이팅 경기장인 강릉아이스아레나의 얼음을 책임지고 있는 배기태 아이스테크니션은 경기장 얼음을 만드는 법을 공개했다.
배 씨는 "겨울에 호수는 위에서부터 얼어 내려간다. 어느 정도 얼면 온실효과 비슷하게 얼음 속 온도가 갇힌다"고 설명했다. 화천천의 경우 25㎝까지만 얼고 멈춰서 얼음에 구멍을 뚫고 물을 끌어올려 더 두꺼운 얼음을 만든다고 한다.
빙상장 얼음은 밑에서부터 얼린다.

콘크리트 바닥에 냉각관을 일정 간격으로 깔고, 그 바닥에 물을 얇게 계속 뿌린다. 10분 정도를 비처럼 뿌리면 0.2㎜ 정도 언다. 이 과정을 250번 정도 반복해야 피겨스케이팅 빙상장을 만들 수 있다. 약 42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또 산소가 없는 얼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얼음 속에 산소가 많으면 색이 불투명해지고 강도도 약해진다. 열전도율도 떨어진다. 올림픽 빙상장에서는 바닥의 냉각관으로 얼음의 온도를 조절해야 하므로 얼음의 열전도율이 좋아야 한다.
종목마다 요구되는 빙질도 다르다.
특히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리는 쇼트트랙과 피겨는 빙상종목 중에서도 상극의 빙질을 요구한다.
배 씨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한 경기장에서 쇼트트랙과 피겨에 모두 적합한 빙질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풀어내고 있다.
쇼트트랙은 영하 7℃, 피겨는 영하 3℃의 표면 온도를 요구한다.

또 쇼트트랙은 3㎝, 피겨는 5㎝ 두께의 얼음 위에서 펼쳐진다. 얼음 색깔도 쇼트트랙은 흰색, 피겨는 은색이다.
쇼트트랙 경기와 피겨스케이팅 경기가 각기 다른 날에 일정 간격을 두고 열린다면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번 올림픽에서는 같은 날 오전에는 피겨, 오후에는 쇼트트랙 경기가 열리는 일정이 몇 차례 있다.
이는 평창대회뿐 아니라 이전의 다른 올림픽에서도 있었던 아이스테크니션들의 숙제다.
배 씨는 "불과 4시간 사이에 빙질을 바꿔야 한다. 펜스 교체 시간과 선수들 웜업 시간을 제공하려면 실질적으로 제게 주어지는 시간은 2시간도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두께는 피겨스케이팅에 맞춘다. 기계 2대로 한 시간을 꼬박 깎아내도 1㎝도 못 깎아내기 때문이다. 색깔도 피겨의 은색으로 고정한다.
대신 피겨 선수들은 쇼트트랙용 스타트·피니시 라인, 포인트 등이 얼음 위에 그려져 있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는 표면 온도다.

배 씨는 "짧은 시간에 표면 온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1년 동안 자료를 정리하고 많은 실험을 해왔다"고 밝혔다.
실제 올림픽 기간에는 관중의 수, 외부 온도가 얼음에 미치는 영향에도 대응해야 한다.
빙상장 바닥의 온도 센서와 냉동기, 공조기 등을 가동해 최적의 표면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배 씨는 "현재 준비 상황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기계만 잘 작동하면 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아이스테크니션이라면 일등이든 꼴등이든 선수들이 '지금까지 본 얼음 중 가장 좋았다'는 말을 해줄 때 피곤이 싹 사라진다"며 "평창올림픽에서 '얼음 좋았다'는 이야기를 꼭 듣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