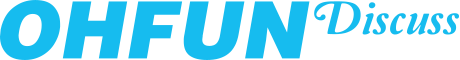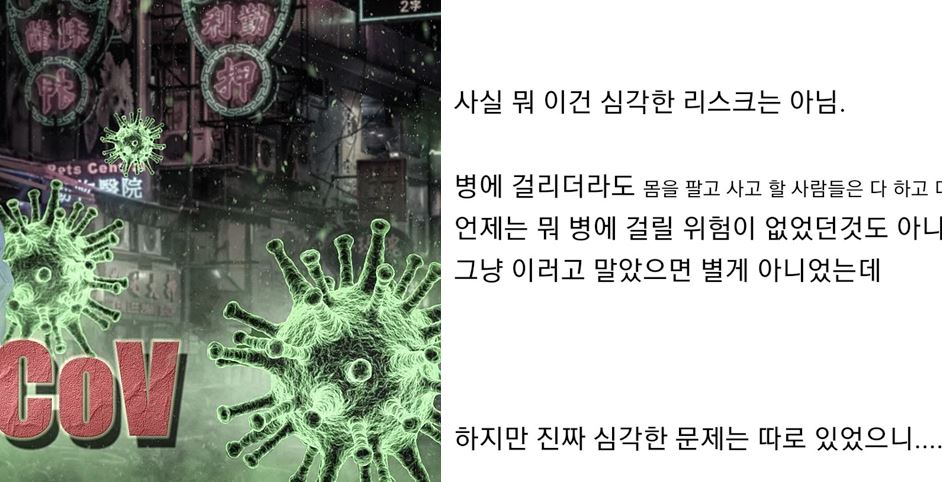코로나19의 여파로 '성매매' 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알려졌다. 감염 확산 우려 뿐만 아니라 확진 판정시 동선이 그대로 공개되기 때문이다.
25일 중앙일보는 한 성매매 업주의 인터뷰 답변 내용을 인용해 "코로나가 터진 뒤 사람 구경을 하기 어렵다"며 "예전에 10명 올 동안 단골 2~3명만 온다"고 전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보다 훨씬 타격이 크다고 했다.
매매 업소는 구매자와 매매자의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곳이라 감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의 법망을 피해 몰래 성매매 소굴로 들어가던 이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성매매조차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박살난 성매매 업계 pic.twitter.com/oERu0XUEdU
— 오늘은 또 무슨 일이 (@hotissue_gall) February 24, 2020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확진 판정 시 받게 되는 '역학조사'를 두려워해서다.
현재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과거 2주간 거친 동선, 결제 내역 등을 모두 조사받는다. 역학조사가 끝나면 대부분의 동선이 보건당국을 거쳐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이런 까닭에 섣불리 성매매를 가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방문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의 역학조사가 또 다른 의외의 이점을 가져왔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현금을 이용해 성매매를 하는 사람의 경우엔 동선 파악도 어렵고 숨기려는 경향이 큰 까닭에 크게 달라질 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